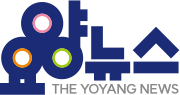지난달 30일까지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한 환자는 3만5839명이다. 이 중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해 직접 연명의료를 거부한 환자는 1만1555명(32.2%)이다. 나머지 2만4284명(67.8%)은 환자가 미처 뜻을 밝히지 않은 채 의식을 잃어 환자 가족들의 합의로 연명의료를 거부했다.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중시하겠다는 연명의료결정법의 취지와는 여전히 거리가 있는 셈이다.
이는 죽음을 터놓고 얘기하는 문화가 아직 정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건강할 때 이런 얘기를 나누지 않으면 큰 병에 걸린 뒤엔 더욱 말을 꺼내기 어렵다. 특히 환자가 먼저 ‘연명의료를 거부하겠다’고 말해도 가족들은 ‘환자의 본심은 연명의료를 계속 받고 싶다는 쪽일 거야’라며 지레짐작하기 일쑤다. 실제 지난해 존엄사법이 시행된 이후 환자가 연명의료 중단 의사를 밝혔음에도 가족들의 극렬한 반대로 제대로 된 상담조차 받지 못하고 숨지는 일이 적지 않다.
윤영호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말기 및 임종기 환자와 가족이 차분히 상담과 심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상담료 등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변홍우 기자
bhongw@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