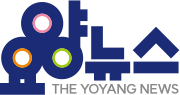노인 일자리 사업의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안전사고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 주로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은 하루에 3시간 남짓 환경미화 같은 봉사활동을 하고 한 달에 30만원 정도를 받을 수 있어 노인들에게 인기가 많지만, 사업에 참여하다가 다치거나 숨지는 사례가 꾸준히 늘어나면서 정부가 일자리 안전관리에 신경을 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인일자리가 매년 대폭 늘어나고 있다. 노인인력개발원에 따르면 2014년 33만개였던 노인 일자리 개수는 지난해 51만개로 1.5배가량 늘었다. 하지만 안전사고의 증가 폭은 훨씬 더 크다. 같은 기간 노인 일자리 참여 중 발생한 사고는 206건에서 1,339건으로 6.5배 증가했다.
사고 유형별(2018년 8월 기준)로는 골절(329건)이 절반에 가까운 45.8%로 가장 많았다. 이어 타박상(65건ㆍ9.1%)과 염좌(48건ㆍ6.7%)등의 순이었다. 노인들은 주로 뼈나 근육이 약해진 탓에 낙상사고를 당하는 일이 많다는 설명이다. 사망 사고도 4건이나 발생했다.
특히 생계비 마련을 위해 일하는 경우 혹시 부상을 알렸다가 일자리를 잃게 될까 쉬쉬하게 된다. 지하철 택배사업단 소속으로 배송업무를 하는 황모(78)씨는 “택배를 배달하다 계단에서 헛디뎌 발목을 접질렸는데, (수행기관에서) 알게 되면 일을 그만하라고 할 것 같아 파스만 붙이고 며칠 절뚝거리며 지냈다”고 했다.
당국의 안전사고 방지 대책도 허술하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초 안전사고예방매뉴얼을 냈는데 ‘길을 건널 때 조심해라’, ‘뜨거운 냄비를 맨손으로 잡지 말아라’같은 내용이 담긴 정도다.
김양진 노인인력개발원 사회참여지원부장은 “모든 노인 일자리 사업에서 안전교육을 최소 3시간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안전사고방지 관련 매뉴얼을 상반기 중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안전교육을 각 사업기관에서 시행하다 보니 수준이 천차만별이고, 형식적으로 이뤄져도 확인할 방법이 없다.
또 노인 일자리 사업에서 인솔자나 안전관리원을 따로 두지 않아 사고가 일어나도 즉각적인 대처가 어렵다. 사업에 참여하려는 노인의 건강 관련 기준이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서울 한 구청의 노인 일자리 담당자는 “면접을 볼 때 병력이나 현재 건강 상태 등을 묻긴 하지만 명확한 불합격 기준은 따로 없고, 신체검사나 건강을 증명할 서류 제출 등의 절차도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