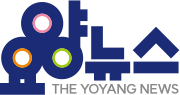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7년 12월까지 적발해 부당이득 환수를 결정한 사무장병원은 1273곳이다. 현행 의료법 제33조와 약사법 제20조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비영리법인 등을 제외한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해선 안된다.
사무장병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질 낮은 의료서비스와 과도한 의료행위 등으로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 악화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의료기관 종별 적발 비율로 보면 요양병원이 8.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전체 요양병원이 100곳이라면 이중 8.5곳이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됐다는 뜻이다. 노인 인구가 늘면서 요양병원 수요가 증가한 것과 맞물린다.
사무장병원 운영원칙은 철저히 ‘돈’이다. 사무장병원 중 의원의 경우 병실당 병상 수가 4.57개 병상으로 일반 의원 2.62개 병상보다 더 많았다.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 좁은 병실에 병상을 늘린 것이다. 또 의료서비스와 직결되는 의료인 고용비율도 일반 의원은 전체 직원의 27.5%인 데 반해 사무장의원은 18.2%에 불과하다. 과잉진료는 기본이다. 사무장의원의 연평균 입원급여 비용은 100만3000원으로 일반 의원 90만1000원보다 많았다. 입원일수는 사무장의원이 15.6일로 일반 의원보다 1.8배 길었다.
의료질도 당연히 차이가 난다. 동일 연령, 중증도, 상병으로 100명이 입원했다고 가정했을 때 300개 병상 미만 병원 사망자는 98.7명, 사무장병원은 110.1명으로 11.4명 더 많았다. 우병욱 건강보험공단 의료기관지원실장은 “사무장병원은 사무장 개인의 수익을 추구하기 위해 운영되다 보니 병실당 병상 수를 더 늘리거나 의료인 고용을 줄이곤 한다”며 “이렇게 되면 적정 의료서비스 질을 담보할 수 없고 환자의 안전이나 감염관리 등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사무장병원은 오랜 세월 정부의 척결 대상이었다. 보건복지부는 2010년 10월 사무장병원 근절대책을 시작으로 주기적으로 대책을 내놓고 시행했다. 2010년 복지부는 사무장병원 개원 후 모든 요양급여 비용 전체를 환수하겠다는, 지극히 당연한 수준의 방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정부 대책을 비웃듯 2011년 사무장병원 적발 후 환수 결정액은 2010년 82억원의 7배 많은 584억원에 이르고 2013년에는 1000억원을 넘어섰다. 건강보험공단도 2016년 2월 의료기관관리지원단(TF)을 구성하고 해마다 조직을 확대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사후조치로는 한계가 있다는 걸 알게 된 복지부는 지난해 의료법인 설립요건을 강화하는 식으로 방향을 틀었다. 복지부는 병원 이사회에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 비율을 제한하고 이사 중 최소 1명 이상은 의료인을 선임하도록 했다. 또 사무장병원의 온상으로 지목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의료기관 개설권을 삭제했다.
이미 개설된 사무장병원에 대해서는 특징 분석을 통해 개발한 78개 지표를 적용, 적발체계를 강화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무장병원 설립과 운영 수법이 지능화하면서 적발에 어려움이 있다”며 “내부고발을 유도하기 위해 면허를 대여한 의사가 자진신고했을 때 면허취소를 면제하는 등 리니언시제도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